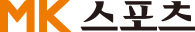정우성, 故 안성기에게서 韓 영화의 정신을 배우다…철인 같았던 5일
배우 정우성이 고(故) 안성기의 마지막 길에서 한국 영화가 무엇이었는지를 몸으로 증명했다. 영정을 들고 선두에 섰던 5일은 애도의 시간이자, 한 배우가 또 다른 배우에게서 영화의 정신을 건네받는 과정이었다.
9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엄수된 故 안성기의 장례 미사와 영화인 영결식은 정우성의 침묵으로 시작됐다. 그는 고인의 영정을 품에 안은 채 말없이 행렬의 앞자리에 섰다. 화려한 수식도, 과장된 슬픔도 없었다. 그 자리는 오롯이 ‘배운 사람’의 태도로 채워졌다.
정우성은 장례 기간 내내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을 맞았다. 상주가 아니었지만,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 이정재가 정부가 추서한 금관문화훈장을 들었고, 설경구·박철민·유지태·박해일·조우진·주지훈 등 후배 배우들이 운구를 맡았다. 한 시대를 이끈 배우의 마지막 길을 또 다른 세대가 함께 메운 장면이었다.









영결식에서 정우성은 추도사에 앞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어렵게 운을 뗀 그는 고인과의 첫 만남을 떠올리며 “마치 오래 알고 지낸 후배를 대하듯 제 이름을 불러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영화 ‘무사’ 촬영 당시를 회상했다. 중국에서 약 다섯 달을 함께 지내며,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안성기는 늘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현장을 다독였다고 했다.
정우성은 고인을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을 앞세우지 않으려 했던 분”으로 기억했다. 타인을 향한 존중은 자연스러웠고, 자신에 대한 높임은 끝까지 경계했다는 설명이었다. 그는 “그 엄격함은 곁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었고, 때로는 한없이 고독해 보이기도 했다”며 “그 모습이 제게는 철인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1957년 아역으로 데뷔한 안성기는 약 70년에 걸쳐 한국 영화와 함께한 배우였다. ‘바람 불어 좋은 날’, ‘고래사냥’, ‘투캅스’, ‘실미도’, ‘라디오 스타’, ‘한산: 용의 출현’까지 그는 시대가 요구하는 얼굴을 가장 정확하게 담아냈다. 아역에서 성인, 노년에 이르기까지 연기 인생 전 과정을 완주한 유일한 배우로 남았다.
정우성이 들었던 영정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배우가 평생 지켜온 태도와 품격, 그리고 한국 영화가 스스로에게 부여해온 책임의 무게였다. 5일 동안 그 곁을 지킨 시간은 애도의 형식이 아니라, 배움의 방식이었다.
영결식을 끝으로 영화인장으로 치러진 장례 절차는 마무리됐다. 고인의 유해는 경기 양평 ‘별그리다’에 안치됐다.
정우성이 걸었던 그 5일은 작별이 아니라 전승이었다. 한국 영화의 정신은 그렇게, 말이 아니라 태도로 이어졌다.
[김승혜 MK스포츠 기자]
▶ 동계올림픽 금메달 김길리, 카리나와 투샷 공개
▶ 라엘, 우월한 글래머 몸매의 핑크 드레스 자태
▶ DJ소다, 비키니 톱+밀착 의상…아찔한 앞·뒤태
▶ 김혜성 맹활약…메이저리그 개막 로스터 청신호
[ⓒ MK스포츠,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 1 ‘홍진경 딸’ 라엘, 못 속이는 모델 유전자 미모…정변의 정석
- 2 카리나랑 선미 투샷인 줄 알았는데 ‘김길리’였네
- 3 5년 전 “3개월 시한부”라더니…유명 래퍼, 상습 마약으로 결국 ‘철창행’
- 4 DJ소다, 1000만원 명품 팔찌는 감추고… 한파 속 비키니는 보란듯이
- 5 ‘득녀’ 챈슬러도 있었다…사이먼과 日서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
- 6 ‘결혼’ 최준희, 외할머니 주거침입 신고 그날…옆엔 11살 연상 예비신랑
- 7 여성암 고백했던 이솔이…‘박성광♥’ 앞 한뼘 비키니
- 8 “옥수수 사주세요” 최준희, 11살 연상 예비신랑…베트남서 꽃다발 이벤트 재조명
- 9 실밥 D-1 랄랄, 두쫀쿠 먹방 “아침엔 살 안쪄”
- 10 ‘256억 포기’ 민희진 “하이브, 모든 민형사 소송 즉각 멈춰” (전문) [MK★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