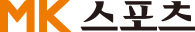“내 동의 없이?” BTS 뷔 직접 등판, 민희진 사적 대화 무단 활용에 ‘당혹’
방탄소년단(BTS) 뷔가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법적 분쟁에 자신의 사적 대화가 무단으로 사용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재판 증거 채택을 넘어, ‘아티스트의 보호자’를 자처해 온 민 전 대표가 정작 승소를 위해 타 소속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철저히 도구화했다는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20일 뷔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제 지인이었기에 공감하며 나눴던 사적인 일상 대화의 일부”라며 “어느 한쪽의 편에 서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무엇보다 그는 “해당 대화가 제 동의 없이 증거자료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당황스럽게 생각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앞서 12일 법원은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민 전 대표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를 받아들여 하이브가 약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을 정당한 의견 제시로 판단했는데, 민 전 대표 측이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핵심 증거 중 하나가 바로 뷔와의 카카오톡 대화였다.

공개된 메시지에서 뷔는 “(맨날 표절 얘기나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 에잉.. 그러니께요. 나도 좀 보고 아 이거 비슷한데.. 했어요”라며 지인으로서 일상적인 맞장구를 쳤다. 하지만 이 사적인 위로는 민 전 대표의 255억 원짜리 승소를 위한 결정적 법적 카드로 둔갑했다.
현재 언론은 재판의 승패와 255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에 주목하고 있지만, 대중이 이번 사건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이면은 따로 있다. 바로 민희진 전 대표를 둘러싼 끊임없는 논란의 본질이다.

민 전 대표는 그동안 대기업 하이브의 자본 논리에 맞서 크리에이터의 권리와 ‘뉴진스’라는 아티스트를 지켜내는 투사적 이미지를 구축해 왔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법적, 경제적 승리를 위해 제3자인 글로벌 스타 뷔의 극히 개인적인 대화를 당사자의 허락도 없이 재판정에 끌어들였다.
이는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한다”는 그녀의 평소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다. 내 새끼(뉴진스)를 지키기 위해 남의 새끼(뷔)를 방패막이로 삼고, 목적 달성을 위해 사적 관계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셈이다. 이처럼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윤리적 모순이야말로 민희진이라는 인물이 탁월한 기획력과 법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대중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비판받는 핵심 이유다.
재판에서는 이겼을지언정, 업계 내 인간적 신뢰라는 측면에서 민 전 대표의 이번 선택은 치명적이다. 지인에게 무심코 건넨 위로가 언제든 법정 증거로 폭로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동의 없는 사생활 폭로로 당혹감을 안긴 이번 사태는, 경영권 분쟁이라는 진흙탕 싸움 속에서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소모되고 있는지를 씁쓸하게 보여준다.
[진주희 MK스포츠 기자]
▶ “다큐라더니 무당 놀음?” 故 김철홍 유족 절규
▶ 라엘, 우월한 글래머 몸매의 핑크 드레스 자태
▶ DJ소다, 비키니 톱+밀착 의상…아찔한 앞·뒤태
▶ 김민재, 프리미어리그 첼시 토트넘 영입후보 포함
[ⓒ MK스포츠,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 1 “내 동의 없이?” BTS 뷔 직접 등판, 민희진 사적 대화 무단 활용에 ‘당혹’
- 2 ‘홍진경 딸’ 라엘, 못 속이는 모델 유전자 미모…정변의 정석
- 3 ‘또 구설수’ 박나래 사건 수사하던 경찰, 퇴직후 ‘박나래 변호’ 로펌 취업
- 4 “다큐라더니 무당 놀음?”…‘운명전쟁49’, 故 김철홍 소방교 유족의 절규
- 5 DJ소다, 1000만원 명품 팔찌는 감추고… 한파 속 비키니는 보란듯이
- 6 “법원 결정 존중”…‘42억 횡령’ 황정음, 이태원 고급주택 가압류
- 7 “시장 바뀌면 순장” 충주맨, 정치와 무관하다더니…‘청와대 입성설’ 해명
- 8 “수영은 안 했는데 분위기는 다 했다”… 홍진영, 1만6800원 수영복에 파타야 석양
- 9 ‘100만 임박’ 충주맨 사직… 충주시 인구 5배 유튜버 떠난다
- 10 “순간 멈칫”… 최준희 런웨이, 뼈말라보다 먼저 떠오른 ‘故 최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