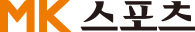박미선, 유방암 투병 끝에 다시 서다… 삶을 다시 배우게 한 10개월의 기록
유방암 투병 이후 처음 방송에 모습을 드러낸 박미선은 담담했다. 이날 그는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짧은 머리와 수트를 입고 등장했다.
“10개월 만에 화장을 했다. 용감하게 나왔다”고 말하는 순간에도 그는 웃음을 잃지 않았다. 병을 지나온 사람이 가진 독특한 평온함과 강인함이 동시에 스며 있었다.
그가 말한 투병의 여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정기검진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았고, 크리스마스이브에 수술대에 올랐다.









“초기라 괜찮다 했는데 열어보니 임파선 전이가 돼 있었다.” 그 말은 평소처럼 담담했지만, 뒤에 따라온 항암 치료의 무게는 여실했다. 폐렴으로 입원했고, 온갖 약과 두드러기, 손발의 감각 소실, 목소리까지 잃어가며 “살려고 하는 치료인데 죽을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그 어떤 미사여구보다도 깊은 절망이 담긴 문장이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웃음을 선택했다. 항암으로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말을 듣고 먼저 삭발을 했고, 그 순간조차 “퓨리오사 같지 않냐”고 농담하며 사진을 남겼다. “언제 또 이런 걸 해보겠나 싶어서 즐겁게 했다”는 말은, 고통을 견디는 그의 방식이 얼마나 단단한지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정장을 차려입고 담대한 표정으로 찍어둔 ‘삭발 프로필’은 그가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했는지 증명하는 기록이 되었다.
그런 어머니의 곁에는 늘 딸이 있었다. 방송에 깜짝 등장한 이유리는 조직검사 결과를 혼자 안고 있었던 엄마의 마음을 떠올리며 “심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다”고 고백했다. 새벽마다 방문을 열어두고, 화장실에 오래 있으면 “혹시 토하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해 달려가던 나날들. 무서워서 울고 싶은 순간에도 “엄마가 더 힘들 테니 내가 울어버리면 무너질까 봐” 이를 악물고 버텼다는 말은 듣는 이의 마음까지 아리게 했다. 누군가의 딸로서, 보호자가 되어가던 어린 성숙함이었다.
남편 이봉원 역시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전했다. 방송에서 “가장 힘들 때 곁에 못 있었다”며 눈물을 보였고, 기타를 배워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연주하며 아내에게 건넸다. 표현에 서툴고 말수가 적은 사람의 사랑은 종종 행동으로 드러난다. 그는 그렇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내의 회복을 응원하고 있었다.
유방암이라는 이름 앞에서 삶은 흔들렸지만, 박미선은 다시 일어섰다. “38년 동안 첫째 낳고 한 달, 둘째 낳고 한 달 쉬었을 뿐이었다”며 돌아본 그의 지난 시간은 전광석화 같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계획을 세우지 않기로 했다. 내년이 어떨지 미리 생각하지 않고, 좋은 일이 생기면 웃고 힘들면 쉬어가며, 물 흐르듯 살아보기로 했다.
그의 선택은 단순해 보이지만, 병을 지나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성찰이다. 완벽하게 살려 애쓰던 과거를 내려놓고, 하루를 온전히 하루로 받아들이는 태도. 그 담백한 문장 속에는 10개월의 고통과 싸움, 그리고 끝내 스스로를 잃지 않으려 했던 시간이 고요하게 담겨 있었다.
박미선이 던진 메시지는 결국 한 줄이었다.
“살아가는 일은 버티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은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아주 작은 숨을 불어넣고 있을지 모른다.
[김승혜 MK스포츠 기자]
▶ “박나래, 링거 이모한테도 불법 의료행위 받아”
▶ 장원영, 밀착 드레스 입어 강조한 글래머 핫바디
▶ 소유, 볼륨감 한껏 드러낸 아찔한 비키니 노출
▶ 손흥민 2025 메이저리그사커 최고 영입 2위
[ⓒ MK스포츠,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 1 “영어 선생님이 평생의 짝으로”… 변요한♥티파니 영, 결혼 전제 열애
- 2 장원영, 왜 자꾸 등 보이나 했더니… ‘등 골’ 살아나는 백리스 전략
- 3 리사, 싱가포르서 왜 이렇게 강렬했나?…‘사이버 히어로×아머 전사’ 실사판
- 4 박나래 매니저 “주사 이모는 극히 일부...추가로 제기할 사안 더 많아”
- 5 장원영, ‘173cm’ 실제로 보면 이런 떨림?… 흑장미 두 송이 삼킨 몸비율
- 6 조진웅 은퇴 직격탄… 이제훈, 침묵으로 남긴 한 장의 시그널
- 7 ‘10kg 대박’ 소유, 비키니 끈까지 풀고 눈감았다… “한군데만 안 빠져” 집중
- 8 이이경 사생활 의혹, 추가 영상 공개…논란 장기화 조짐
- 9 팝핀현준, 학생 논란 책임 인정 후 교수직 사임… “교육자로서 부적절했다”
- 10 박나래, 주사 이모에 링거 이모도 있었다...“의사 아닌 거 같아” 의심 발언도 [MK★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