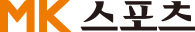강백호도 박찬호도 없다? 롯데, 김태형 임기 마지막 시즌도 빈 손 행보?
강백호도 박찬호도 없다?
롯데 자이언츠가 스토브리그에서 빈 손에 그칠 조짐이다. 김태형 감독의 계약 임기 마지막 해 확실한 전력 보강을 기대했던 팬들의 마음도 애가 타게 됐다.
롯데가 겨울 이적시장에서 3년 연속 잠잠한 모습이다. 롯데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일각에선 롯데가 박찬호를 비롯한 다수의 선수 영입에 관심이 있다는 소문이 많았지만 내부에선 오히려 특별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올해도 롯데는 조용할 것 같다”며 올해 거인의 이적 시장 행보를 예상했다.

올해 8년 연속 가을야구 실패를 경험하면서 외부 FA 시장을 노리는 통 큰 행보를 보일 것이란 일각의 기대나 전망과는 사뭇 다른 행보다. 특히 이번 FA 시장에 최대어로 꼽히는 매물인 강백호와 박찬호 모두 롯데에 필요한 유형의 야수들이었단 점에서 롯데 팬들의 기대는 더 컸다.
먼저 강백호는 최근 FA 시장에 나온 매물 가운데 최고의 거포 유형의 타자다. 올 시즌 독보적인 팀 홈런 최하위(75개), 팀 장타율 8위(0.372)에 그친 롯데에게 내년 시즌 가장 절실한 부분은 우선 공격력과 장타력의 반등일 터다.
물론 강백호가 최근 4시즌 커리어에 기복이 크다는 점은 가장 큰 약점이다. 하지만 통산 OPS가 무려 0.876에 달하는 타자다. 지난 시즌에는 27홈런 96타점으로 여전한 거포 본능을 보여줬다. 타율 0.265/15홈런/61타점으로 부진했던 올해도 강백호의 장타율은 0.467이었다.
올 시즌 롯데의 주전급 선수 가운데 이를 넘어선 선수는 외국인 타자 빅터 레이예스(0.475) 밖에 없었다. 그 다음이 윤동희의 장타율 기록 0.433이었을 정도로 올해 ‘장타 실종’의 어려움을 겪었던 롯데였다.
하지만 롯데의 강백호 계약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은 분위기다. 강백호 역시 우선 메이저리그의 계약 오퍼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국내 팀들의 조건이나 제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엔 빅리그 도전을 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런 상황에 롯데가 적극적으로 거액 계약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영입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

박찬호도 마찬가지다. 김태형 감독이 직접 ‘영입 1순위 희망 선수’로 꼽기도 했던 박찬호는 두산 베어스와 4년 80억 원 수준의 FA 계약이 임박했다. 복수의 야구 관계자에 따르면 두산은 FA 이적 시장이 열리는 동시에 다수의 팀이 영입을 노렸던 박찬호에게 적극적인 제안을 했다. 그리고 두산은 박찬호 측과 13일 계약에 합의하고 14일 구체적인 조건 조율도 마친 것으로 알려진다.
수년간 유격수 포지션에 어려움을 겪던 롯데의 입장에서 박찬호 역시 간절한 선수였다. 2023년을 앞두고 롯데는 노진혁을 4년 50억원에 데려오면서 유격수를 보강하려 했지만 결국 영입은 실패로 돌아갔다. 매 시즌 내야수 육성에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고 있지만 확실한 결실은 맺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박찬호가 합류했다면 롯데의 젊은 내야수들의 교통 정리가 가능했던 것은 물론 그 선수들의 체계적인 육성과 함께 당장 다음 시즌 내야의 연쇄적인 수비 안정은 충분히 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역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었던 두산이 박찬호를 중심으로 내야의 새 판을 짜기로 결정하면서 통 큰 계약으로 선수의 마음을 잡은 모양새다.
박찬호의 계약 규모에 대해선 ‘오버페이’라는 지적도 충분히 나올만하다. 하지만 여러 팀의 경쟁이 붙으면서 해당 계약 수준이 아니면 ‘박찬호를 잡을 수 없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런데 정작 박찬호 영입전을 이끌 것으로 야구계 내부의 전망이 많았던 롯데는 오히려 영입 제안조차 하지 않았다는 소식도 있다.
언론을 통해 롯데 구단 내부에선 ‘박찬호 영입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팬들의 마음도 차갑게 식고 있는 모습이다. 롯데가 결국 지난 2시즌과 같이 다시 FA 시장에서 빈손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서다.
이대로면 김태형 감독의 계약 마지막 시즌인 올해도 역시 롯데는 FA 시장에서 빈 손일 가능성이 크다. 2023시즌을 앞두고 롯데는 7년 연속 가을야구를 이끈 ‘우승 청부사’ 김태형 감독을 야심차게 데려왔다. 하지만 내부 FA이자 베테랑 선수인 불펜투수 김원중과 구승민을 잔류시키는 정도가 롯데가 추가로 보여준 모습의 전부였다.
[김원익 MK스포츠 기자]
▶ 김선호 탈세 혐의분 납부→1인 법인 폐업 절차
▶ 홍진영, 밀착 수영복 입어 강조한 글래머 몸매
▶ 블랙핑크 제니, 파격적인 일본 도쿄 무대 의상
▶ 김재열 국제빙상연맹 회장, 올림픽집행위원 당선
[ⓒ MK스포츠,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 1 “수영은 안 했는데 분위기는 다 했다”… 홍진영, 1만6800원 수영복에 파타야 석양
- 2 “결혼만 남았다”…하정우♥차정원, 9년 장기 열애 증거는 ‘비숑’? [MK★이슈]
- 3 판타지오 측 “김선호 1인 법인 정산금...개인소득세 더해 추가 납부 완료” (공식) [전문]
- 4 제니가 곧 장르다…도쿄 홀린 ‘전신 시스루+망사’ 파격 패션
- 5 레드벨벳 ‘조이’ 맞아? 극한 다이어트 성공 후 선사한 비주얼 쇼크 근황 포착
- 6 “2026.02.05” 민희진, 실크 셔츠에 수놓은 ‘새’ 꿈... 뉴진스 엄마의 제2막
- 7 백도빈, “독신주의자였는데…” 정시아 울린 한마디… 가족 위해 커리어도 접었다
- 8 “아내가 이대 출신 의사인데” 고지용, 너무 아파 보이는 근황…‘간’ 문제?
- 9 “나는 언제나 승리했다” 심권호, 침묵 속 간암 수술 성공 레전드다운 멘탈
- 10 “롯데 정철원 가정폭력·외도”…‘러브캐처’ 김지연, ‘파경’ 이유 밝혔다[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