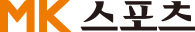“아빠 없다고 생각했다” 김지연, 끝내 선을 넘은 순간
김지연의 말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은 짧지 않았다. “아빠 없다고 생각하고 키워야겠다는 마음까지 들었다”는 한 문장은, 단순한 감정 토로가 아니라 오랜 고민 끝에 도달한 결론에 가까웠다.
Mnet ‘러브캐처’ 출신 인플루언서 김지연은 25일 SNS 질의응답을 통해 정철원과의 이혼설 속에서 겪어온 현실을 비교적 담담한 어조로 털어놨다. 그 중심에는 늘 아이가 있었다.
그는 비시즌에도 집에 거의 없는 남편의 생활 패턴을 언급하며 “아이가 아빠를 잘 못 알아볼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한테 너무 미안했지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마음이 무너졌던 순간을 떠올렸다.








맞벌이 상황에서도 육아와 집안일, 개인 일까지 대부분 혼자 감당해야 했던 시간도 적지 않았다. 김지연은 “너무 힘들어서 새벽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며 “그날 경기가 잘 안 풀리면 결국 제 탓이 되는 말들을 들었다”고 했다. 당시에는 그 말들이 예민하게 꽂혔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이 스스로를 더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고 했다.
결정적인 균열은 사소한 부탁에서 시작됐다. 김지연은 비시즌 당시 집안일을 두고 갈등이 있었던 일화를 전하며 “아들 옷까지 같이 개어달라고 했다가 ‘앞으로 1000만원 넘게 줄 건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냐’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말을 “잊히지 않는 순간”이라고 표현했다.
생활비를 둘러싼 오해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김지연은 “월 1000만원이라는 말은 조건이 붙은 이야기였고, 비시즌에는 그 돈이 아니라 제가 모은 생활비와 제 수입으로 지내야 했다”며 “사실 매년 겨울은 거의 제 수입으로 버텨왔다”고 설명했다. 돈의 액수보다, 책임의 방향이 문제였다는 뉘앙스였다.
그가 끝내 ‘선을 넘었다’고 느낀 지점은 아이였다. 김지연은 “이번에도 참으려 했지만, 가출 이후 일방적으로 양육권 소송을 걸었다는 말을 듣고 엄마로서 더는 참으면 안 되겠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부부의 문제를 넘어, 아이의 삶이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던 순간이었다.
이후 김지연은 생활 환경에 대한 고민도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는 “부산이 좋긴 하지만 아이 얼굴이 너무 알려져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아이를 위해 서울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장 결정된 것은 아니며, 정해지면 알리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김지연의 말에는 분노보다 체념이, 폭로보다 선택이 담겨 있었다. ‘아빠 없다고 생각했다’는 말은 상대를 지우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아이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단단하게 세우겠다는 다짐에 가까웠다.
한편 김지연과 정철원은 지난해 12월 아들을 얻은 뒤 뒤늦게 결혼식을 올린 바 있다. 이후 불거진 이혼설 속에서, 김지연은 지금도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는 듯했다. 무엇을 버려야 아이를 지킬 수 있는지.
[김승혜 MK스포츠 기자]
▶ 샘 오취리, 활동 중단 5년 만에 논란 사과
▶ 이성경 시선 집중 섹시한 볼륨감 & 드레스 자태
▶ 블랙핑크 제니, 아찔한 파티 퍼포먼스 사진 공개
▶ 여고생 최가온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금메달 감동
[ⓒ MK스포츠,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 1 “변호사 포기하고 배우로” ‘슛돌이’ 지승준, 너무 달라진 얼굴…이모부가 류승수였다
- 2 “수영은 안 했는데 분위기는 다 했다”… 홍진영, 1만6800원 수영복에 파타야 석양
- 3 제니가 곧 장르다…도쿄 홀린 ‘전신 시스루+망사’ 파격 패션
- 4 “BTS 광화문 공연에 26만 명 몰릴 것”…경찰, 특공대 전진 배치
- 5 ‘SNS→인종차별 논란’ 샘 오취리, 활동 중단 5년 만에 “상처 드려 죄송” 사과
- 6 ‘절제된 비너스상’ 이성경, 김준수가 극찬한 이유 있었다
- 7 제니, ‘샴페인 걸’ 논란에도 생일 사진 공개…사과 대신 선택한 자신감
- 8 민희진, 255억 풋옵션 소송 1심 승소에 “하이브도 고생...음악으로 보답할 것” [전문]
- 9 故 오요안나 비극이 MBC 기상캐스터 전원 해고…사람이 문제인데 ‘직업’을 없앴다
- 10 ‘정준과 결별’ 김유지, 닮은꼴 예비신랑 공개...5월의 신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