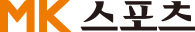주심, 이정효 감독 퇴장 이유 답변 거부···‘규정으로 소통 봉쇄’ K리그 심판은 ‘최고존엄’인가요 [이근승의 믹스트존]
3월 29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전하나시티즌과 광주 FC의 경기. 후반 추가 시간이었다. 주심이 경기를 갑자기 중단시켰다. 주심은 대기심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광주 이정효 감독에게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취재진과 구단 관계자들은 무슨 일이 발생한 건지 알 수 없었다. 중계 화면에도 이정효 감독이 어떤 행위로 퇴장을 당했는지 나오지 않았다. 이날 경기를 현장 중계한 강성주 해설위원은 방송에서 “이정효 감독이 물병을 바닥에 던졌다”고 설명했다. 관련된 장면은 이후에도 나오지 않았다.
경기 후 관계자들에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물었다. “이정효 감독이 판정에 불만을 품고 물병을 걷어찬 것으로 안다”고만 전해 들었다. 자세한 설명은 듣기 어려웠다.



이정효 감독을 대신해 경기 후 기자회견장을 찾은 광주 마철준 수석코치는 말을 아꼈다.
마철준 수석코치는 “경기 중 일어난 일이라서... 이 부분에 관해선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광주 관계자도 마찬가지였다. 광주 관계자는 “우리가 판정과 관련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다”고 했다.
경기 후 공동취재구역(믹스트존)에서 만난 주세종도 “같은 팀원으로서 조금 아쉬웠다”며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다”고 했다.
광주의 모든 구성원이 이정효 감독의 퇴장 상황과 관련해 말을 아낀 데는 이유가 있다.
K리그는 심판 판정에 관해 부정적인 언급을 하는 걸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이를 어길 시엔 징계를 내린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정관/규정 제6장 상벌 유형별 징계 기준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엔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취재진은 이날 경기 후 믹스트존에서 심판진을 기다렸다. 주심에게 이정효 감독이 퇴장당한 이유를 물어보고자 했다.
주심은 멀찌감치 떨어져 퇴근하려고 했다. 취채진이 규정상 다가갈 수 없는 구역이었다. 대전 관계자에게 “‘주심에게 가서 이정효 감독의 퇴장 이유를 묻고 싶다’고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주심은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주심은 대전 관계자를 통해 “우린 인터뷰할 수 없다”고 했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대한축구협회(KFA) 심판 규정 제20조 ‘심판의 의무’ 제4항엔 이렇게 나와 있다.
주심은 KFA의 승인 없인 판정과 관련된 일체의 언론 인터뷰를 할 수 없다. 이게 ‘의무’다.
K리그는 프로야구, 프로농구 등과 달리 경기 중 논란이 될만한 판정 시 그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는다.



프로야구, 프로농구 등에서도 판정 논란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비디오판독 시스템(VAR)을 활용할 땐 경기장을 찾아준 팬과 함께 문제의 장면을 돌려본다. 판정 후엔 왜 그런 판정을 내렸는지 설명한다.
K리그는 아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설명을 해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현장에선 판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도 들을 방법이 없다. 규정으로 들을 수 없게 만들어놨다.

이정효 감독이 물병을 걷어차서 퇴장당했다면 더더욱 설명이 필요했다.
KFA 경기규칙 제12조 파울과 불법행위 ‘경고’엔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팀 구성원이 음료수 병 등을 걷어차는 행위는 ‘경고성 반칙’이라고 규정해 놓았다. 그런데 이날 이정효 감독은 레드카드를 받았다. 이정효 감독이 이에 앞서 경고를 받았던 것도 아니었다. 다이렉트 퇴장이었다.

판정은 이날만의 문제가 아니다. 매 시즌 매 라운드 반복되고 있다.
“판정의 일관성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매 시즌 매 라운드마다 듣는다. 다만, 심판 판정과 관련해선 어떠한 부정적인 언급도 할 수 없게 강제해 놓아서 말을 아낄 뿐이다.
K리그엔 경기 전 양 팀 출전 선수 명단이 아니라 ‘주심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하는 이가 상당수다.
한국 축구계 심판들은 항상 억울함을 호소한다. 나름대로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존중받지 못하고, 비판만 받는다는 게 그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주장의 공통된 요지는 ‘우리의 사정을 알아달라’는 거다.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면,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해줘야 하는 게 상식이다.
K리그의 수많은 구성원이 판정 하나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한다. 한 경기를 위해 일주일 이상 흘린 땀과 노력이 알 수 없는 판정 하나로 물거품 되는 일이 흔하다.
자신이 좋아하는 팀의 경기를 지켜보기 위해 일주일을 기다리는 팬들도 마찬가지다. 귀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경기장을 찾는 팬들이지만, 의아한 판정에 관해선 어떠한 설명도 들을 수 없다.
프로축구가 존재하는 이유가 팬들이라면, 왜 그런 판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규정이 소통을 가로막는다면, 바꿔야 정상이다.
프로야구나 프로농구처럼 팬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설명하는 게 싫다면,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이나 믹스트존을 통해 왜 그런 판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된다.
판정이 왜 그렇게 내려졌는지 설명만 해주면 된다.
여러 축구계 관계자가 이에 대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바뀌는 건 없을 것”이라고 한다. 불통으로 심판을 향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구단, 감독, 선수, 팬 등 K리그 모든 구성원이 ‘판정도 경기 일부’라고 되뇌고 또 되뇌지만, 커지는 건 심판을 향한 불신뿐이다.
한국 축구계가 대단한 착각에 빠진 게 있다. 존중을 강요하고, 강제할 수 있는 시대는 한참 전에 지났다.
한 라운드가 끝나면 KFA 심판위원회는 분석소위원회를 열어 판정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낸다. 이후 왜 그런 판정을 내렸는지 통보한다. 오심을 인정한다고 한들 경기 결과가 바뀌는 건 아니다.
존중과 소통은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시대다.
[대전=이근승 MK스포츠 기자]
▶ 흑백요리사 우승 최강록 “현실로 돌아오는 연습”
▶ 블랙핑크 제니, 아찔한 파티 퍼포먼스 사진 공개
▶ 이성경 시선 집중 섹시한 볼륨감 & 드레스 자태
▶ 오현규, 잉글랜드축구 프리미어리그 3팀이 주목
[ⓒ MK스포츠,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 1 ‘상금 3억원’ 최강록, 새벽 귀가·칼 갈기하다 외도 오해…딸도 몰랐다
- 2 ‘린과 이혼’ 이수, 혼인 중 매입한 강남 건물로 초대박 터트렸다 “70억 잭팟”
- 3 류현진 옆에서…배지현 “너도 연락했잖아” 황재균, 8년 만에 멈춘 웃음
- 4 제니, ‘샴페인 걸’ 논란에도 생일 사진 공개…사과 대신 선택한 자신감
- 5 ‘절제된 비너스상’ 이성경, 김준수가 극찬한 이유 있었다
- 6 조윤희, 9세 딸과 조용히 한국 떠나…이동건 떠올린 ‘그림 선물’
- 7 ‘13남매 장녀’ 남보라, 여동생 결혼식서 임신 중에도 춤…벅찬 축하
- 8 “누적 매출 1조” 안선영, 50대의 인기 기준…“돈 쓰는 사람 말고 곁에 두고 싶은 사람”
- 9 “지켜주겠다 약속했는데…” ‘뉴진스 엄마’ 민희진, 소송전 앞에서 돌변한 이유
- 10 ‘임신설 종결’ 홍진영 “벗으면 장난 아냐” 하더니…뱃살 삭제→진짜 벗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