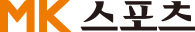정우성·이정재는 앞에, 설경구·유지태는 곁에…故 안성기 영화 같은 영결식
누가 상주였는지를 묻는 대신, 누가 어디에 섰는지가 더 많은 이야기를 남겼다. 故 안성기의 마지막 길은 이름만으로도 한 시대를 증명하는 배우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나누며 완성됐다.
‘국민 배우’ 故 안성기의 발인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에서 장례 미사와 영화인 영결식이 엄수된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고인의 뜻에 따라 미사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영결식은, 형식보다 사람들의 ‘태도’가 더 깊은 울림을 남기고 있다.
영결식에서 배우 정우성은 추도사를 맡아 고인을 향한 존경과 기억을 전한다. 오랜 시간 안성기를 ‘선배’이자 ‘어른’으로 존경해온 정우성의 목소리는, 한 배우의 업적을 넘어 삶의 자세를 되짚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이정재는 고인에게 추서된 금관문화훈장을 들고 앞에 선다. 두 사람은 운구보다 먼저, 마지막 길의 문을 여는 역할을 맡았다.






운구는 배우 설경구, 유지태, 박철민, 박해일, 조우진, 주지훈 등이 함께 담당한다. 화려함보다는 무게를, 앞섬보다는 곁을 택한 선택이었다. 한 영화계 관계자는 “누가 상주냐보다, 누가 곁에 서느냐가 더 중요해 보이는 장면”이라며 “각자의 위치가 너무 정확해서 오히려 영화 같았다”고 말했다.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는 나흘째 조문객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배우와 영화인뿐 아니라, 스크린을 통해 안성기의 연기를 보며 자랐다는 일반 관객들도 빈소를 찾았다. SNS에는 포스터보다 현장 사진, 공식 기록보다 개인적인 기억들이 공유되며 ‘국민 배우’라는 수식어가 어떤 시간 위에 놓여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했다.
안성기는 1957년 데뷔 이후 70여 년간 한국 영화의 성장과 함께한 배우였다. 세대를 넘나드는 연기, 현장에서의 절제, 후배를 대하는 태도까지. 그가 남긴 유산은 작품 수보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더 가까웠다.
정우성과 이정재가 앞에 서고, 설경구와 유지태가 곁을 든 이번 영결식은 그 가르침이 여전히 현재형임을 보여준다. 상주가 아니어도 책임을 나누고, 말없이 자리를 지키는 어른들의 모습. 故 안성기의 마지막 길은 그렇게,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장면으로 완성되고 있다.
[김승혜 MK스포츠 기자]
▶ 가수 유승준, 래퍼 저스디스와 협업 공식 예고
▶ 트와이스, 파격적인 란제리 화보들 잇달아 공개
▶ 기은세, 시선 집중 브라톱+레깅스 섹시 핫바디
▶ 배지환 뉴욕 메츠 40인 명단 제외…마이너 이관
[ⓒ MK스포츠,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 1 속옷도 패션이 됐다...트와이스, 역대급 란제리 화보에 팬들도 ‘깜놀’
- 2 ‘43억 횡령’ 황정음, 소속사에게 손절 당해...“전속계약 해지 통보” [전문]
- 3 “집에서 필라테스?” 기은세, 전남편 재력설 선 긋기…이혼 후 더 탄탄해졌다
- 4 “둘의 공통점, 군대” 유승준×저스디스 협업에 싸늘한 시선
- 5 “가르치던 사이” 서울대 출신 김혜은, ‘언론고시 3관왕’ 전현무 선생님이었다
- 6 “쌩 담배 냄새 난다”…박나래, 녹취 한 줄에 ‘흡연 논쟁’까지?
- 7 “마지막 출근” 송혜교, 손때 묻은 대본 4권…753억 대작의 끝
- 8 “레깅스 밀착핏의 정석”...조현, 완벽 힙업+골반 라인에 시선 집중
- 9 이제훈, 본캐 찾고 떠난다… ‘모범택시’ 엔진, 시즌4에서도 켜질까
- 10 “조세호,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조폭들과 유착…수억 협찬·접대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