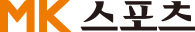“말은 없었다”…조용필, 故 안성기 떠난 날 ‘친구여’로 남긴 작별
‘가왕’ 조용필은 말하지 않았다. 대신 노래를 불렀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를 떠나보낸 날, 그는 설명도 해명도 없이 무대 위에 섰고, 그 선택은 곧 작별의 방식이 됐다.
조용필은 지난 9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전국투어 서울 공연 무대에 올랐다. 객석을 가득 메운 1만여 관객 앞에서 그는 평소와 달리 유독 잦은 눈맞춤과 짧은 미소로 팬들과 호흡했다. 하지만 공연 내내 고(故) 안성기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날은 조용필에게 각별한 날이었다. 중학교 동창으로 6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온 배우 안성기가 세상을 떠난 날이었기 때문이다. 조용필은 비보가 전해진 직후 빈소를 찾아 마지막 인사를 건넸지만, 무대 위에서는 그 슬픔을 말로 풀어내지 않았다.





대신 선택한 건 노래였다. ‘친구여 모습은 어딜 갔나 그리운 친구여’, ‘서로 사랑한 친구가 있었네 이제는 모두 떠나버리고 홀로 남아’, 공연 중 울려 퍼진 가사들은 그날의 의미를 또렷하게 만들었다. 설명이 없었기에, 관객은 더 깊이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친구여’가 흐르던 순간, 공연장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떼창도 환호도 잠시 멈췄고, 노랫말 하나하나가 객석을 지나갔다. 말 대신 노래로 전해진 감정은 오히려 더 직접적이었다.
조용필은 평소 공연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날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다만 노래 사이사이 팬들에게 “여러분이 있기에 제가 노래할 수 있다”, “전 행복합니다”라는 짧은 말만을 건넸다. 그 절제된 태도는 오히려 고인을 향한 존중처럼 읽혔다.
무대 위 조용필은 여전히 흔들림 없었다. ‘태양의 눈’을 시작으로 ‘킬리만자로의 표범’, ‘그 겨울의 찻집’, ‘단발머리’, ‘바운스’까지 2시간 넘게 라이브를 이어갔다. 고음에서도, 박자에서도 흐트러짐은 없었다. 하지만 그날의 무대는 어느 때보다 감정의 결이 깊었다.
공연을 지켜본 관객들 사이에서는 “오늘 노래가 다르게 들렸다”, “설명은 없었지만 다 느껴졌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조용필의 선택은 애도의 선언이 아니라, 조용한 전송에 가까웠다. 말하지 않았기에 더 분명했다. 조용필은 그렇게, 노래로 친구를 보냈다.
[김승혜 MK스포츠 기자]
▶ 황정음 횡령 1심 유죄 가족법인 여전히 미등록
▶ 베리굿 조현 완벽한 레깅스 자태…예술적인 몸매
▶ 효민, 밀착 의상 입어 돋보이는 글래머 핫바디
▶ 52억 FA 계약 투수 장현식 LG에서 반등할까
[ⓒ MK스포츠,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 1 속옷도 패션이 됐다...트와이스, 역대급 란제리 화보에 팬들도 ‘깜놀’
- 2 “둘의 공통점, 군대” 유승준×저스디스 협업에 싸늘한 시선
- 3 “집에서 필라테스?” 기은세, 전남편 재력설 선 긋기…이혼 후 더 탄탄해졌다
- 4 ‘43억 횡령’ 황정음, 소속사에게 손절 당해...“전속계약 해지 통보” [전문]
- 5 “조세호,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조폭들과 유착…수억 협찬·접대 받아”
- 6 “레깅스 밀착핏의 정석”...조현, 완벽 힙업+골반 라인에 시선 집중
- 7 “가르치던 사이” 서울대 출신 김혜은, ‘언론고시 3관왕’ 전현무 선생님이었다
- 8 “오늘도 있지롱 호피” 효민, 롱헤어 덜어낸 변화…결혼 9개월 차의 선택
- 9 박나래, 침묵이 만든 반전…‘마지막 입장문’ 이후 달라진 여론
- 10 “쌩 담배 냄새 난다”…박나래, 녹취 한 줄에 ‘흡연 논쟁’까지?